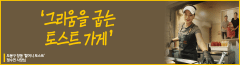[사즉생과 '뉴삼성' (3)끝]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주 52시간' 예외 포함 특별법 시급
국내 반도체 업계, 외국업체와 기술 격차 두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요구
반도체 R&D, 긴 시간 역량이 필요한 특성 지녀...획일적 근무시간 적용 곤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 52시간 근무제 획일 적용에 개선 필요성 내비쳐
야근·연장근무 강요하는 시대 끝나...추가 근무 따른 충분한 보상 마련해야
2023년 반도체 불황과 시작된 ‘삼성전자 위기론(論)’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었다. 반도체 시장 변화 흐름을 제때 읽지 못해 불거진 기술 경쟁력 악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가 맞물려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회사의 위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바꾸게 만들었다. 이재용 회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던진 첫 메시지는 '사즉생(死卽生·죽기로 마음 먹으면 산다는 뜻)'이다. 이재용 회장은 회사 경영진에게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는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투데이>는 달라진 그와 함께 삼성의 반도체 업계 위상 회복과 업계 맹주 탈환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3회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R&D(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원천봉쇄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AI(인공지능)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놓고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업계가 외국 기업과의 기술 초격차(경쟁업체가 추격할 수 없는 기술 격차)를 거머쥐려면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정 노동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주말을 포함한 52시간으로 바꿨다.
당시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 근로시간 엄격 관리에 다른 경영 유연성 부족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했다.
다만 제도가 안착되도록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계도기간이 끝나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도입됐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산업계 시각은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팽배하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직된 노동시간 제한이 이어지면 자칫 글로벌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 주력 사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R&D는 종종 긴 시간 역량을 쏟아내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업무 특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첨단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자칫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국회는 이 같은 요구를 계속 외면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여겨 반도체에 한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라는 대안을 내놨다.
법정 연장 노동시간 이상으로 불가피하게 업무를 해야 할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기존 노동법에 따르면 반도체 R&D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라며 "이를 보완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확대한 것이 이번 대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15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2024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단위로 15차례에 걸쳐 1658명에 이르는 R&D 인력에 대해 총 23만875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 2023년에는 7회에 걸쳐 1358명을 대상으로 19만5552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했는데 중복인원을 감안할 때 2년간 43만4304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논의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반도체 기업에 당분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다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해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도입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도체 계열사 SK하이닉스를 둔 SK그룹도 같은 입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인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모습에 우려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취임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동의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법을 만들 때 좋은 취지지만 항상 취지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규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하지만 너무 많은 비대한 규제는 모든 사람의 자율을 억압하고 창의성을 추락시켜 성장과 현재 사회 문제를 푸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 52시간 근무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어지면서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계열사 전반에 걸쳐 주 64시간 근무제 도입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노동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측과 기술 경쟁력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측과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사업이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두는 것은 자칫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특히 지금처럼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등 특수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질한다고 해서 마치 야근이나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시절도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지금은 그것을 밀어붙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며 "산업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무를 허용하고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연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끝>
BEST 뉴스
댓글(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