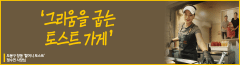[최환종 칼럼] 전략사령부 창설에 관한 소고(小考)⑤ : 합참과의 관계설정 등 지휘체계 관련된 문제점 해결해야
기존 육·해·공군의 작전사령부와 충돌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전략사령관 직책을 어느 군에서 수행할지도 논란거리로 부상할 듯

[뉴스투데이=최환종 전문기자]
3. 예상되는 논란(지휘체계, 각 군의 고민과 이해관계)
전략사 창설에는 각 군의 고민과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얽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전략사 창설’ 준비 단계에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 번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 지휘체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육·해·공군의 전략 자산은 평소에 각 군에 소속돼 있으나 전·평시 작전 지휘는 전략사령부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이것은 전략사가 별도의 전략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육·해·공군 전력(육군의 미사일전략사, 해군의 잠수함사령부, 공군의 F-35A와 미사일방어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 편성될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령부(미래 연합사) 예하의 구성군사령부 소속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각 작전사는 전략사와 또 다른 지휘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기에 작전 수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략사가 창설되면 합참과의 관계가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합참은 그동안 육·해·공군·해병대의 전투 부대를 지휘하는 한국군의 최고 군령 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대내외적인 위기(아덴만 여명작전 등)를 관리하는 등 국방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전략사령부는 현재 합참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를 모체로 하여 전략사령부로 확대될 예정이고, 전략사령부는 '북핵·WMD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합참 임무의 상당 부분을 전략사령부가 맡는 셈이다. 물론 전략사는 일반적인 전투 임무가 아닌 전략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전략사령부가 창설될 경우 특정 부분에서는 합참과의 관계가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자칫 전략사가 ‘옥상옥’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섣부른 얘기이겠지만 미국 합참의 경우를 일부 참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물론 미국과 한국은 영토의 크기나 작전구역, 임무 수행 내용 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군은 한국군과는 달리 미군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없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 자문 역할만 수행한다. 대신 지역별로 6개(태평양, 중부, 유럽, 아프리카, 북부, 남부), 기능별로 5개(전략, 수송, 특수전, 사이버, 우주)의 통합전투사령부가 주요 작전 부대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두 번째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휘체계의 혼란과 더불어 전략사령부가 각군의 첨단 무기체계 사용과 관련하여 기존 육·해·공군의 작전사령부와 충돌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전략사령부가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육·해·공군이 심혈을 기울여 양성하고 운영해온 각종 전력(육군의 미사일전략사, 해군의 잠수함사령부, 공군의 F-35A와 미사일방어사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육·해·공군의 작전사령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귀한 자식(무기체계)을 전략사에 대여해 주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각 군의 작전사령관들은 “평소에 작전 장비 관리, 작전 요원 훈련, 전술 개발 등은 내가 하고 있는데, 전략사령관은 그런 귀중한 전력을 곶감 빼먹듯 가지고 가는가?” 하는 식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평시에 각 군의 작전사령부는 수행해야 할 고유의 임무가 있다. 기계획 임무와 실시간 임무로 구분할 수 있을텐데, 전략사에 일정 부분의 전력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 각 군 작전사령부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용한 자산은 한정되어 있고 각 군과 전략사에 주어진 임무는 많을 테니 각 군의 첨단 무기체계 사용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아울러 전략사령부가 북한 내의 전략목표를 타격하려면 북한내 타격목표를 '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북한내 목표물에 대한 표적화 기능은 공군 작전사령부가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목표물에 대한 표적 처리 기능’은 학교에서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찰위성 등 각종 정보자산이 필요함은 물론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가치있는 표적을 만들 수 있는 숙달된 요원과 오랜 경험 등이 있어야 ‘목표물에 대한 표적화“가 가능하다.
결국 전략사령부 자체에서 북한내 타격목표를 '표적화'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장시간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공작사(공구사)와 ‘북한내 타격목표의 표적화 임무’가 겹치게 되어 예산과 노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
한편, 전시에는 공군 구성군사령부가 한국 전구에서 표적화 및 목표물에 대한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데(한국 전구에서 공중작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공군구성군사령부에 있다), 전시에는 전략사령부와 공군구성군사령부의 권한과 임무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세 번째, 전략사령관 직책을 어느 軍에서 수행할지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전략사령부에 속하는 전략무기가 대부분 현무 계열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이어서 육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경우와 같다고 본다.

위 그림(북한 위협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개요)에서 보듯이 해군과 공군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천t급 잠수함, F-35A 전투기와 패트리어트(PAC-3), 천궁-2 등의 다양한 미사일 방어 전력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성격이 다른 무기체계를 어느 특정 軍의 장교가 모두 다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계속)
◀ 최환종 프로필 ▶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前 순천대 우주항공공학부 초빙교수, 前 공군 방공유도탄여단장, 공군 준장 전역
BEST 뉴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